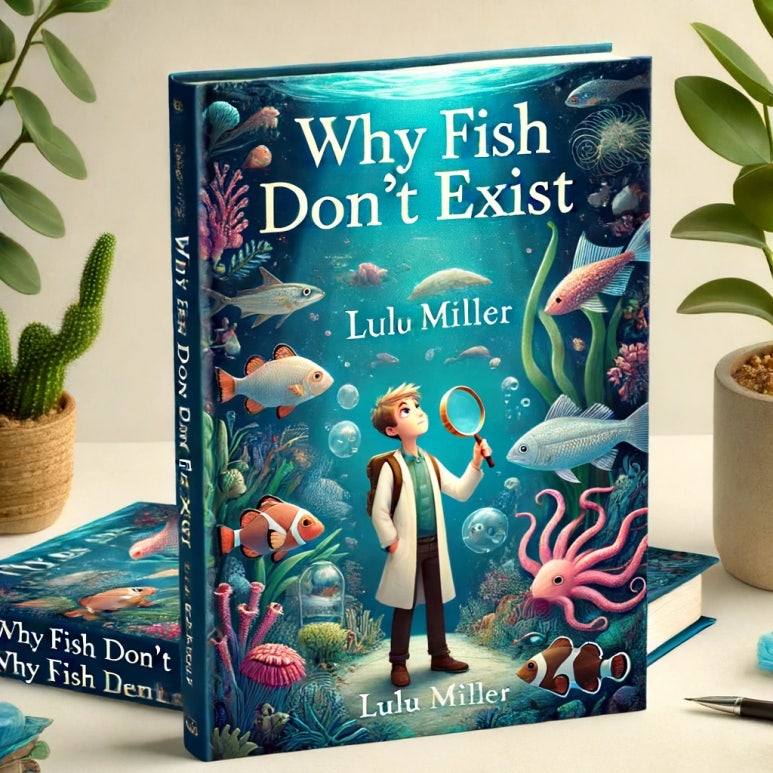
#물고기는존재하지않는다 #룰루밀러
처음 이 책을 집어 들었을 때, 제목이 너무나 도발적이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뒤집는 이야기인가 싶어 호기심이 생겼다. 처음엔 소설인가 싶었고, 읽다 보니 다큐멘터리와 에세이의 중간 어디쯤에 걸쳐 있는 책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책은 과학의 진보와 그 이면의 어두운 역사를 따라가며,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와 분류,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생학이라는 어둠, 그리고 나의 무지
책이 본격적으로 다루는 우생학 이야기는 나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분류하고, 열등하다고 평가된 이들을 강제적으로 억압했던 시대. 나는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정말 저런 사람이 존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유전적으로 번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매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릇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를.
과학이 가져다준 빛이 때로는 얼마나 암울한 그림자를 만들었는지를.
특히, 책 속에서 애나의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라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적합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돌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일까.”
아이를 원했지만 불임화라는 비극을 강요당한 애나. 그녀의 꿈과 정체성을 빼앗아간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폭력이었다.
과연 누구도 타인의 존재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제거할 권리는 없다. 그저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본능으로 삼는 생명체일 뿐인데, 인간은 언제부터 누군가를 **‘불필요한 존재’**로 분류하고 규정하기 시작했을까.
긍정적 착각과 나의 비관주의
책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이 등장한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장밋빛 자기 기만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착각’**은 현실을 조금 비틀어 보며 스스로를 속이는 태도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꽤나 비관적인 사람이다. 무언가 일이 잘 풀려도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의심이 먼저 든다.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 일종의 실마리를 던졌다.
적당한 긍정적 착각은 삶을 더 견디기 쉽게 만든다고.
조금 더 낙관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봐도 괜찮다고.
“쇼펜하우어도 명랑하게 살라고 했으니, 나도 좀 자기 기만을 해보자.”
그래, 어쩌면 나의 비관주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작은 걸림돌이었을지도 모른다.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서
과학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왜 그렇게 세상을 나누고 분류하려고 할까? 이 책은 물고기라는 생물학적 분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어왔던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준다. 생명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가 만들어놓은 카테고리와 체계는 어느 순간 무너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 안도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질서는 늘 불완전하다.”
물고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만든 기준과 이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책을 덮으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과 철학, 인간의 어리석음을 넘나드는 책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제목에 낚여 읽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쯤엔 마음이 복잡해졌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내게 남은 건 두 가지다.
- 조금 더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보기.
- 어떤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음을 기억하고, 타인과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
과학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완벽한 질서란 없다는 것.
그러니 때로는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정된전쟁 #그레이엄앨리슨 (1) | 2024.12.23 |
|---|---|
| #진보와빈곤 #헨리조지 (1) | 2024.12.22 |
| 핸드 투 마우스 - 부자 나라 미국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빈민 여성 생존기 (0) | 2024.12.20 |
| #사는게고통일떄,쇼펜하우어 #박찬국 (2) | 2024.12.19 |
| #콜미바이유어네임 #안드레애치먼 (3) | 2024.12.18 |



